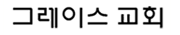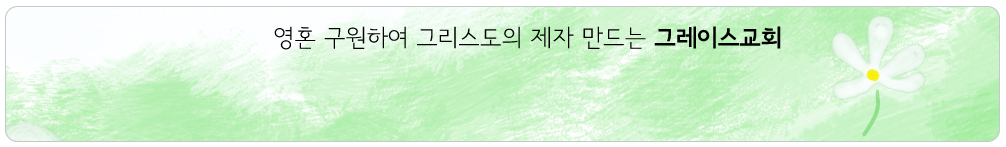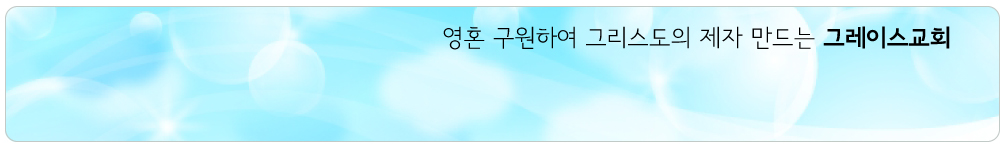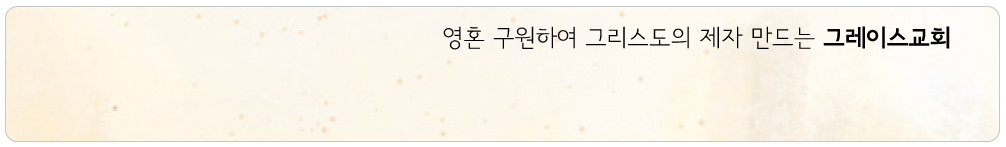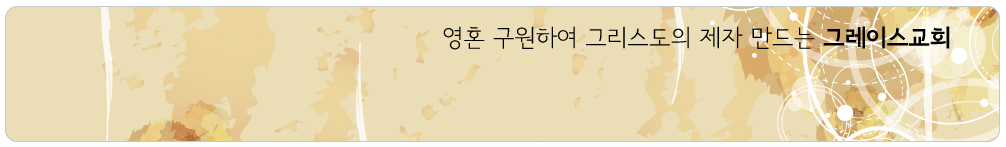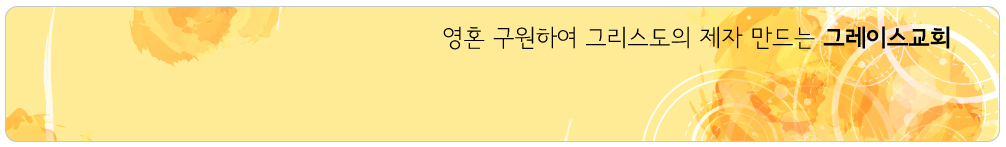나눔 게시판
HOME > 나눔터 > 나눔 게시판
짧은 글(64): ‘그 아들의 기도에 십자가로 응답하신 그 아버지!’ (2)
바로 앞글에서 살핀 감람산, 그러나 여기선 그 감람산의 오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정말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네모반듯한 조그마한 밭엔 가지런히 잘 손질된 채 각자의 자리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마치 고목에서도 꽃이 핀 듯 싱싱함을 자랑하며 서있었고, 바로 중간 한 길 건너편엔 2인치가 넘을 듯 너무 날카롭게 생겨 두렵기까지 한 많은 가시들을 온 몸에 가득 품은 가시나무가 감람나무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오래 된 전통으로 온 몸을 감싼 유대인들처럼 오래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백성들을, 날카로워 무섭지만 초라하게 보이는 작은 가시나무는 고뇌의 관을 쓰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10여 전에 그곳을 방문해서 길 한 복판에 서서 양편으로 나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감람나무와 가시나무, 그 두 실체를 바라본 한 이방인 관광객의 한 사람이었지만,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는 잊을 수 없는 슬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한 참 동안 서 있었다. 그러나 2천 년 전 주님께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닥쳐올 고난과 죽음 앞두고 그 동산에 어디에선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뜻을 물으시며 애타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날카로운 가시관과 살점을 도려내는 채찍과 수치스러운 나무 십자가라고 대답해주셨던 곳이 바로 그 감람산 어디쯤이다. 어쨌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시자, 그분을 체포하려고 마치 공권력의 힘을 과시하듯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눅22:52)’, 다른 한 손엔 횃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께선 그들이 밝힌 횃불이 아니라, 빛이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그들이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몸소 드러내셔서 그들의 불법체포에 순순히 응하셨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손에 든 횃불들로 어둠에 잠긴 감람산을 밝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했던 그 일, 그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까? 그곳엔 유대 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3년간이나 주님의 제자로 회계의 돈 자루를 맡았던 유다가 배반자의 신분이 되어 그의 배반의 키스로 자기 스승을 체포하라고 신호를 보낸 곳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동산 감람산,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 어디 그뿐인가? 주님의 기도의 동산에 동행했던, 그러나 기도가 아니라, 잠에 빠졌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 곁을 떠나 도망친 곳도 그 밤의 감람산이었다.
진정 그날 밤의 감람산은 암흑 속에 잠긴 어두운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주체인 듯 횃불을 들고 당당하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젊은 청년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를 붙잡아오도록 보냄을 받은 체포조 무리들은 배반자 유다를 비롯해 모두 하수인들이었고, 그들을 감람산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오도록 사주한 주체는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지배하던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힘센 종교인들도 진정 그 밤에 감람산의 어둠을 이용한 주관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을 몰아내서 세상을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고 날뛰던 어둠의 세력들이 기도의 동산 감람산을 어둠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주님께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해주셨다.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이다(눅22:53).’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답게 대제사장의 관저로 주님을 압송해 감히 밤새 주님을 재판했다. 밤에 벌인 재판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자들이 불법 재판으로 무죄하신 주님을 정치적 압력을 가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 지르며 외치자,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숨을 거두셨고, 그 뒤에 한 병사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19:31).’ 더 이상 땅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벗으시려는 듯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를 미리 보여주시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우영>.